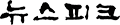[뉴스피크]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수원시내 곳곳에 파란색이나 빨간색 점퍼가 자주 눈에 띈다.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다.
주말 커다란 교회 입구나 광교산, 팔달산 근처에서도 수원시의원ㆍ경기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얼굴 알리기용 명함 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쓴 상태로 인사를 하다보니, 명함 돌리기는 구닥다리 방법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홍보수단이다.
대체로 명함 앞면엔 커다란 얼굴 사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이름, 선거구가 적혀 있다. 뒷면에는 ㄱ초등학교, ㄴ중학교, ㄷ고등학교 졸업 등 출신 학교와 ㄹ연합회 회장, ㅁ봉사단장 등 주요 경력들이 즐비하다.
개중엔 OO선 조기 착공, 군공항 이전 같은 공약이나 자신의 전문분야 또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호를 적어 넣은 것도 있다.
선거에 나선 경기도의원ㆍ수원시의원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시민의 대변자’를 자임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봉사하겠단다.
하지만 참 이상한 현상이 있다. 최근 받은 상당수 예비후보들 명함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 휴대전화는커녕 사무실 전화나 이메일조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몇몇 예비후보에게 ‘왜 휴대전화 번호를 적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다.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도 있고 없는 명함도 있다’,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는 줄 몰랐다’거나 ‘선거명함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가장 솔직한 답변은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였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출마자가 예비후보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을 ‘쓸데없는 전화’로 취급하다니, 그 자가 살아온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자격 미달이다.
물론 예비후보가 명함에 휴대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자가 시민을 대하는 진정성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분명히 말한다.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넣지 않는 명함은 감히 주권자인 시민 앞에 내밀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