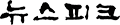2012년 8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갤러리 잔다리에서는 도나타 벤더스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벤더스’라는 성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잔잔하고 극적인 감동을 전해준 빔 벤더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나타 벤더스는 그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아내이기도 하다.
그녀에게서 빔 벤더스의 영상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감성을 기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지도 모른다. 동반이기는 해도, 그녀는 자신만의 감성과 지향을 가진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흑백사진을 자신의 작품으로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는 것에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비가 춥게 내리던 날 서교동 한 구석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갤러리 잔다리를 찾았다. 비와 흑백사진은 왠지 잘 어울려 보인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녀의 사진은 날씨와 너무 잘 어울려 보였다.
사실 기대는 남다른 다큐멘터리 사진이였다. 그건 그녀의 한국에서 첫 개인전에 대한 소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도니타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다.
작가는 주로 흑백사진으로 인물, 도시풍경 등을 담아내며 사진에 대한 고전적 접근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단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화된 고유성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나타의 사진은 대상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얼굴의 표정, 몸짓, 사물의 ‘내적인 울림’을 포착하는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다. 이런 작가적 접근은 우리가 흔히 동네의 거리나 일상의 주변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대상들에 특별한 품위를 부여한다.”

우리는 보통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인물, 도시를 기록한 흑백사진이라고 한다면, 흑과 백이 선명한 그리고 계조가 살아 있는 사진과 작품을 상상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진들은 모호하고, 흐릿하며, 또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인화지는 마치 쓰다 남은 종이에 인화액을 발라 사용한 듯 얼룩이 져 있었고, 사진은 그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모호한 선과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진들은 아름다웠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나타 벤더스는 1965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현재 그곳에서 활동중이다.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 영화와 연극을 전공하였고, 영화 촬영감독으로 여러 작품들에 참여하기도 했다.”
“도나타 벤더스의 방식은 이른바 환원주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표현적 요소는 흑 black 백 white 빛 light 시간 time 이다. 모든 불필요한 묘사나 삶을 둘러싼 물리적 방해물이 제거된 채 온전히 자기 안으로 침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진 속 대상이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도나타의 사진들에 매료되고 공감하는 이유는 내면적 성찰의 특별한 순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 - 마크 기스본 미술비평

사진을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었다.
단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순간 굳어진 듯한, 영화의 그 한 장면을 기억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이면의 이야기와 감성을 그저 그대로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작품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서 흑백사진의 매력을 생각하게 된다.
단지 선이 명확하고,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만이 흑백사진의 매력이 아닌 것이다. 경계와 주제 그리고 대상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사진은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아름다움과 의사를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 3층까지 이루어진 벤더스의 사진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흑백사진이 가진 매력을 느껴보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지금 우리 주변의 흑백사진은 너무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