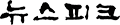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단 두량짜리 열차지만, 아득함을 찾아가는 여행길이니 낡고 소탈한 모습이 더욱 어울려 보이기도 한다.
지금 찾아가는 이세의 신사는 5세기 경에 세워졌으니 일본국과 그리고 건국의 신화와 함께 해온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움직이는 묘한 나라 일본에서 일찍부터 시작된 순례여행의 종착지는 그곳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신화를 국가의 과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무대 역시 거기일 수밖에 없다.
신화란 과거의 이야기이고, 포근하게 신비로운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들썩이는 대지와 화산에 불안해하는 이 땅은 아직도 생생한 현재이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와 민족은 불안과 신비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원의 땅으로 가는 길이 화려하고, 신속한 시스템과 구호와 함께했다면 그다지 반갑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노골적인 반감마저도 있었을 터이다.

사람도 많지 않기에 통로에 일어서면 앞과 뒤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나고야 시를 벗어난 열차는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면서 논과 밭 사이를 달리며, 가끔씩 징검다리를 건너듯 마을의 처마를 부딪칠 듯 스쳐지나간다.
삶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나가는 기차가 아닐까 싶고, 짧지 않은 거리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종교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삶과의 거리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편안함이 주는 만족감과 현실감은 신비한 종교가 생기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인 셈이다.
그래서 이세라는 일본의 국가적인 종교와 신념 또는 욕망으로 채색된 그곳이 이렇듯 시골의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게 잘 감추는 것인지, 종교의 기원과 다르게 현실의 정치가 그것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이용하는지는 결코 답을 할 수 없는 물음일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은 포장에도 능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도 능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절제하는 만큼 그것을 배출할 방법과 수단에 그만큼 또 익숙한 나라이자 사람들이기도 하다.

길이 그러니 역도 소박해야 구색이 맞다. 마치 우리의 시골 간이역 같이, 세월의 호젓함이 기둥과 지붕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세 역이었다. 사실 조금 의외이기는 했다. 거대한 역사 정도는 아니라도 화려한 선전의 광고와 안내문 그리고 그에 걸 맞는 그림과 색이 곳곳에서 시야와 마음을 찔러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적하고, 사람 또한 보이질 않는다.

그나마 골목으로 들어서면 세월을 엿볼 수 있는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는 한다. 그전까지 이세의 주인공들은 오래되었음이 너무도 명확한 여관을 비롯한 인상적인 건물들도 보인다. 다만, 그 건물들은 멋있거나, 세월의 연륜을 담고 있는 고즈넉함 보다는 한산한 쇠락을 더욱 느끼게 해준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에 그들 국가신도의 신화로 창조되어 불편할거라 생각된 이 도시와 신사의 경계 안에서의 나름의 편안함을 발견하게 된다.

사진 김영민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