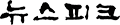일본에는 성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탓에, 그리고 지역별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성이 적어도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대부분 전쟁에 무너지고, 다시 콘크리트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옛 건물이 주는 따뜻함과 경이로움을 맛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변 지역은 공원 등으로 만들어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에도시대의 수도였던 도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 뿐만 아니라 옛 권력자의 자취를 따라 다양하고, 거대한 공원이 사방에 걸쳐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도 성을 허물고 만들어졌던 일왕의 거처가 공원으로 꾸며진 천황공원天皇公園이 도시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꼭 들리지만 가장 재미없는 곳이 바로 성과 그 주변의 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역사흔적이다 보니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가장 인상 깊던 게 사소함의 섬세함이라면 가장 놀랍던 건 날선 해자의 성벽이었습니다. 유려한 선으로 마감된 저 거센 성벽의 탄탄함이라니. 우리 성의 부드러운 곡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굳세고, 억척스러운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는 느낌입니다.

에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그 에도 성을 허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이지 시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옛 자취를 철저히 허물고 그 위에 다시금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일왕의 숙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 근대적인 기념비와 노력은 알다시피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처참한 전쟁은 주변과 자신을 다시 파괴하였고, 일왕의 공간은 텅 빈 공원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란 도시인에게 무엇일까요? 아마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여백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 일본의 중심에 자리한 숨구멍에서는 게걸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안한 여백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일왕의 거처가 엄격하고,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움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치열하고, 복잡하고, 끝이 없었던 정치적 욕망의 진화와 생명 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숨고르기임을 우리는 독도 문제나 자위대 문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워놓고, 그렇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억누름과 분출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의 미학이 있는 셈입니다.

도쿄의 가장 거대한 숲과 나무를 거느린 메이지진구明治神宮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곳은 다른 두 곳보다 좀 더 노골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게 근대는 가슴 아픈 성장통成長痛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아픔이기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성장통을 일본은 메이지이신明治維新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인들은 중세와 근세의 흔적들을 에도 성과 함께 철저히 지우고, 서양의 근대와 함께 고대의 신화와 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현대에 부활한 살아있는 신이 바로 메이지 일왕과 그의 부인이었으며, 그를 기리고 있는 사당이 바로 거대한 공원으로 둘러싸인 메이지진구입니다.
메이지진구와 그 주변의 산림지역은 그 규모와 분위기가 심히 장대하고 시원해, 불편해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안에 품고 있는 나무만도 12만 그루에 이르고, 규모에서 도쿄에서 최대인 곳이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조금 울창한 곳으로 들어서면 마치 산속으로 들어온 듯이 주변이 컴컴해짐을 느낄 정도입니다. 게다가 자잘한 자갈이 깔려 버석거리는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도리이鳥居가 나옵니다. 오래된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내보이는 이 도리이는 1,700년 된 삼나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2미터, 기둥의 지름만 1.2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갛게 치장된 다른 도리이와 다르게 나무의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무의 연륜 때문인지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곳을 지나 잠시 들어가면 마치 산사의 산문에 도착한 듯한 조용한 신사의 입구가 나옵니다. 그 너머에 넓은 광장과 함께, 뒤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과 숲의 나무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기백과 마음을 가다듬는 듯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신사가 보입니다. 그 처마 밑의 그늘과 도심 안에서의 고즈넉함이 좋기는 하지만, 후회가 없는 당당함이 아닐까 생각되어 심히 아름답고도 불쾌합니다. 이 나라를 꼼꼼히 보다보니, 보는 이마저 상반된 감정이 편안하게 교차하는 듯합니다.
진구 앞에는 전통을 입고 있는 관리인들은 근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입과 손을 씻은 참배객들은 끊임없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귀결이 이렇게 단정하고 고즈넉하게 치장되어 있다면, 그 욕망에 누가 돌을 던지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들은 치욕마저도 미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엉큼함과 세심함을 가졌으며, 또한 보란 듯이 자랑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역사는 결국 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혹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만들고 스며들다 보면 역사의 본연의 의미를 사라지고 포장된 것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 포장에 있어서는 결코, 둘째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이지진구를 역사 포장의 전범이라 기억하는 이유이고, 일본인과 그 나라가 이런 포장에 능숙한 곳이라는 생각이 화인처럼 새겨지는 이유입니다.